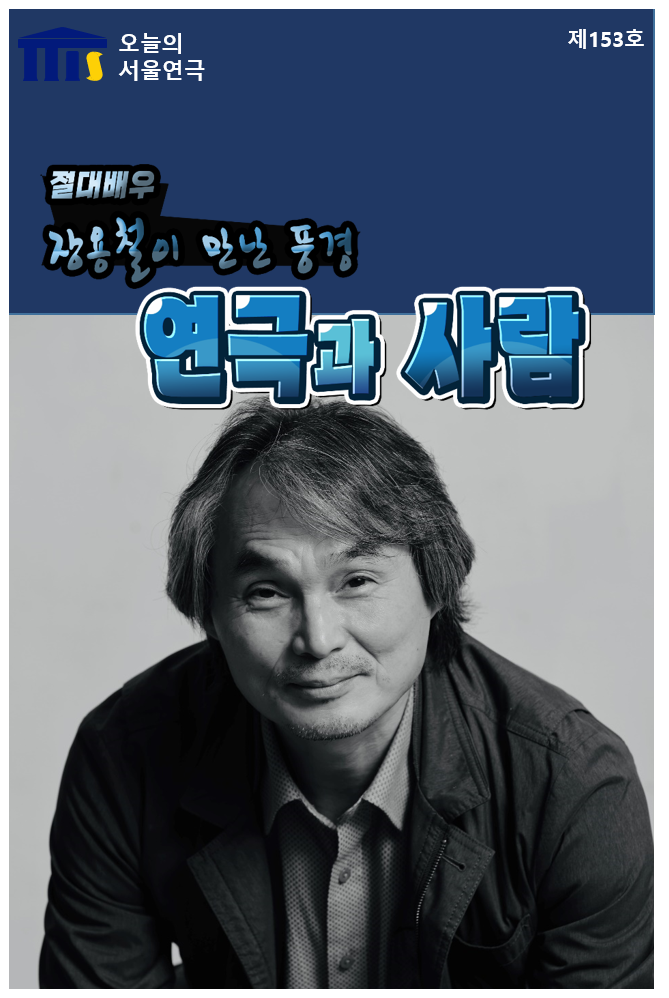글_장용철 (극단 작은신화, 좋은희곡읽기모임)
우리가 연극을 보는 이유는 무엇일까? 혹은
지금의 나보다 더 불행한 사람들을 어떻게 바라보는가?
이렇게 적어놓고 한참 헤매입니다. 초등학교 교사가 학교 교실에서 자살을 하고 대도시의 한가운데 어느 피트니스에서 막 걸어나온 청년이 무참히 칼에 찔려 살해당하는 뉴스가 흐려지지 않습니다. 이렇게 끔찍한 세상과 처절하리만치 한정적인 공간에서 생존의 한계에까지 치닫고 있는 우리의 연극은, 이 세상 사람들에게 과연 어떤 의미가 있을까? 우리가 아직도 이 세상에 동참하고 있다고 믿을 수 있나? 동시에, 우리는 지금 여기서 이토록 연극에 몰두하고 있어야하는 게 맞나? 라는 생각에 멱살 잡혔습니다.
10평 안팍의 객석에 열명이 채 안되는 관객과 함께 앉아서 묵직하고 거칠게 ‘우리들 자신’을 파헤치고 있는 연극 <색> (조우 원작, 최원석 각색과 연출, 극단 인어)에 빠져들었다가 연극이 끝나고 문득 이 막막한 세상에 다시 내던져지면서 무턱대고 황폐해지고 말았습니다. 등장인물보다 절실할 수 없음에도 등장인물만큼 투철할 수 없었음에 또다시 부끄러웠습니다. 출연배우와 함께 찍은 사진을 SNS에 올리면서 우리의 현재가 아직은 용케 살아남았음을 증거하는 허망할 일일랑은 하지말자고 다짐을 하고, 연극을 보고 돌아오는 길 위에서, 나처럼 빠르게 이 세상을 온몸에 묻히고 있는 연극 동지들을 딱히 응원할 방법 없으니 영혼이 곧장 무너지곤 하였습니다.
우리가 아직도 인생의 절망을 담고 있는 비극을 만나야하는 이유가 분명 있겠습니다. 기원 전 5세기경 그리스의 아테네 사람들은 전쟁이 멈추면 연극을 만들고 즐겨보았습니다. 그들은 과연 어떤 심정이었을까요? 신과 인간의 관계가 그토록 중요했던 것일까요? 정의와 현실을 똑같은 값으로 치고 왜 자꾸 연극을 보여주려고 했을까요?
소포클레스는 비극 ‘안티고네 (BC441)’, ‘오이디푸스 왕 (BC429)’을 썼습니다. 주변 도시 국가들과의 끊임없는 전쟁으로 삶이 점점 망가져가는데도 그들에게 연극이 도대체 무엇이길래 야외극장으로 우르르르 몰려갔을까요? 극장의 자취만 남아있고 사람들의 흔적은 보이지 않으니 지금 우리와 똑같은 사정이었던 것은 아니었겠지요? 설마? 연극에 등장하는 사람들에게서 그들은 무엇을 보았을까요? 자신보다 더 불행한 사람을 과연 어떤 심정으로 바라보고 있었을까요? 우리들이 비교적 어린시절부터 그리스 비극을 보고자랐다면 뭔가 조금이라도 달라지지 않았을까요?
언제든지 흩어져 버릴 수 있는 만남, 호랑이–돼지–칼 든 사람
현재 서울 대학로 도처에서 ‘진짜연기와 가짜연기’ 또는 ‘진짜와 가짜’가 말씨름 하는 시절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실체없는 둘이서 서로 마주보는 모양새가 오히려 참 오래도록 마냥 그러고 있었던 듯 합니다.
진짜는 언제나 칭찬받고 가짜는 항상 나쁜가? 마침내 가짜는 어떻게 진짜를 무찌르는가?에 대한 실마리를 우리가 아직도 희곡을 읽고 극장으로 달려가서 연극을 보는 이유에서 찾아냅니다. 현실보다 더 현실처럼(진짜처럼) 미장센을 보여주는 영상과는 다르게, 여전히 우리의 연극은 바로 코앞에서 저 등장인물의 인생에 깊게 연루되며, 우리 스스로 겪고 있는 이 참혹한 현실의 이면을 제각각 상상하도록 합니다. 연극(이야기)에 대해 골몰하던 이의 문장을 오늘 다시 읽습니다.
희곡집 [배삼식] (2015, 민음사)의 뒤에 실려있는 강연록, <多聲的 세계로서의 희곡> 584쪽에 아래와 같이 나온 글을 읽고 화들짝 놀랐습니다. 배삼식 작가는 演劇(연극)에서 극(劇) 하나를 떼어내어 이렇게 설명합니다.
<본디, 극(劇)은 명사가 아니라 형용사로 쓰이던 글자입니다. 이 글자는 무엇인가가 정도를 넘쳐서 불편한 상태. 번거롭거나 뭔가 지나치도록 조화로움이 깨진 상태를 가리킵니다. 劇(극)이라는 글자를 들여다보면 아주 재미있게 생겼습니다. 먼저 호랑이(虎)가 버티고 있고 그 호랑이 밑에 돼지(豕)가 있고, 그 밑에 칼(刀)자가 붙어서 극이라는 글자를 만들고 있습니다. 호랑이와 돼지와 칼을 든 인간이겠죠. 이 세 존재가 어딘가에서 만나 마주 서서 서로를 노려봅니다. 이 만남은 아슬아슬하고 버겁습니다. 언제든지 흩어져 버릴 수 있는 만남, 마주침입니다. 이 상태는 필연적이거나 영원한 것이 아니며 오히려 일시적이며 순간적, 상대적인 것입니다. 극이라는 글자는 이렇게 우연한 마주침의 순간을 포착합니다. 이 순간에 각각의 존재는 자신들의 온 존재를 다해 갈등하며 서로를 드러냅니다. 저는 이 점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극은 우리 삶에 있어 가능한 한 회피해야 할 부정적인 상태를 가리킵니다. 이러한 갈등 자체가 그를 하는 목적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조화롭고 원만한 어떤 상태에서는 쉽게 드러나지 않는 삶과 세계의 어떤 국면을 드러내기 위해 사용하는 일종의 시험대, 하나의 방편일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평온한 상태를 원하지만 결코 평온할 수 없는 우리가 아무렇지 않은 척 극장을 들어서는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회피해야 될 부정적인 상태인 그 갈등에 대하여 어찌 회피할 수 있을지를 궁리하며 오늘을 지내고 있습니다.
무대 위에 서성이는 인물들이 무대 밖에 앉아있는 우리를 보면 뭐라고 말을 걸어올까요? 희곡을 읽다보면 알게 됩니다. 가슴에 뭐 있는 사람들이, 여기 뭐 없는 척 하는 나를 오히려 위로하고 있습니다. 마음에 못 하나 박힌 채로 살아가는, 그 뭔가 큰 거 하나씩은 있는 사람들만 모여있는 게 바로 연극이니까, 그러므로 우리의 삶 역시 ‘오히려 일시적이며 순간적이고, 상대적이며 영원하지 못하다는 것’을 일깨우는 이 무거운 연극을, 칼을 들고 매순간 우뚝우뚝 서있어야하는 일만은 투철하게 피하고 싶었던 우리가 아직도 철저하게 우리의 연극을 보는 이유는 바로 ‘아슬아슬하고 버겁고, 언제든 먼지처럼 흩어질 수 있는’ 우리의 만남에 대한 심심한 위안 정도는 되지 않을까요? 다시 질문해봅니다.
지금의 나보다 더 불행한 사람들은 어디에서 왔을까?
혹시 나와 어떤 관계가 있었을까?
- 무료정기구독을 원하시는 분은 ohskon@naver.com으로 메일을 보내주세요.
- 리뷰 투고를 원하시는 분은 ohskon@naver.com으로 원고를 보내주세요.